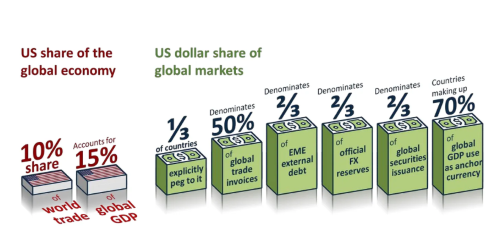‘부자들의 나라’: 요트가 스톡홀름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Ezgi Deliklitas, Unsplash
‘부자들의 나라’: 요트가 스톡홀름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Ezgi Deliklitas, Unsplash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정당한 명성을 누려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스웨덴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안드레아스 세르벤카가 “초부유층의 천국”이라 부를 정도로 변화했다.
현재 스웨덴은 세계에서 1인당 달러 억만장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를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20년 전 부유세(스웨덴어: förmögenhetsskatten)가 폐지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설명해준다. 같은 해에 도입된 가사노동과 주택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후한 세금 공제도 그 일환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 가정의 청소 고용률 증가는 이 나라가 점점 양극화된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나는 세금 제도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이며, 최근에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남부 교외에 거주하는 은퇴자들과 함께 그들이 인생 후반기에 겪는 세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복지국가의 점진적 축소와 함께 진행됐다. 많은 인터뷰 참여자는 스웨덴이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서 응집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케르스틴(74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릴 적 시작했던 것을, 지금 파괴되는 걸 보고 있다. 나는 전쟁이 끝난 뒤 태어나 이 사회를 내 동료 시민들과 함께 평생 만들어왔다. 그런데 세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소득 불평등 지표)는 최근 0.3 수준까지 상승했으며(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이는 1980년대 약 0.2였던 것에서 증가한 수치다.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0.29다. 벵트(70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스웨덴에는 억만장자가 42명이나 있다. 엄청나게 늘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예전엔 이렇게 부자가 되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은퇴자들과 마찬가지로 벵트 역시 자신들의 세대가 이 변화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우리가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었던 세대를 기억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문제는, 우리는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부자들의 나라로 변해가는 걸 몰랐다.”
아메리칸 드림의 반대
스웨덴의 부유세는 1911년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기준으로 과세했다. 거의 동시에, 스웨덴 복지국가의 첫 걸음인 국가 연금 제도도 1913년에 도입되었다.
이런 복지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인 ‘폴크헴메트(folkhemmet, 국민의 집)’는 모든 이에게 안락함과 안정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념적 반대였다. 예외적 성공이 아닌, 합리적인 삶의 수준과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목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유세는 소득세와 분리되어 몇 차례 인상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4%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었다. 다만 복잡한 면세 조항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유세 수입은 0.4%를 넘지 않았다.
1980년대 말, 스웨덴 정치 기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거릿 대처 치하의 영국과 미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및 금융시장 규제 완화 흐름과 일치했다.
스웨덴 부유세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그것이 역진적이라는 점이었다. 주로 중산층의 자산(주택, 금융자산)에 과세하면서도 대기업을 소유하거나 상장기업 고위직을 가진 초부유층은 면세되는 구조였다. 또 다른 비판은 부유세가 조세 회피를 부추긴다는 것이었으며, 특히 자산을 조세 회피처로 빼돌리는 방식이 많았다.
 스톡홀름 전망 좋은 가정집. 출처: Maryna Nikolaieva, Unsplash
스톡홀름 전망 좋은 가정집. 출처: Maryna Nikolaieva, Unsplash
“우리 탓도 있다”
부유세는 자국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 제도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저 2006년에 당시 우파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했을 때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1년 전 중도좌파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한 것에 이어진 조치였다.
마리안(77세)은 이렇게 회상했다. “부유세가 폐지됐을 때, 그게 백만장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모든 걸 소유한 귀족 같은 부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부유세나 상속세 폐지는 그냥 실용적인 일처럼 보였고,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리안과 다른 은퇴자들은 복지국가를 ‘로빈 후드식 분배’가 아닌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한 것으로 기억했다. 이는 초기에는 농촌 출신의 가난한 대중이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 것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부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다.
스웨덴은 여전히 부동산 및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많은 노년층 면담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부유세의 폐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억만장자와 사회 해체로 이어진 사회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얀(72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아이들,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는 두 딸을 생각하게 된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복지국가가 제공해준 좋은 학교, 축구와 연극 수업, 치과 치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
얀은 이 변화에 있어 자신의 책임도 언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내 탓이기도 하다. 우리는 게을러지고 안일해졌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부유세를 없애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뀐 것 같다.”
“더 인간적인 사회에서 산다는 것”
나의 연구는 부유세의 영향이 단순히 세수와 부의 재분배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들은 더 넓은 사회적 함의를 가지며,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현재 전체 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세 나라뿐이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는 특정 자산에 한해 부유세를 부과하지만, 전체 자산에 대해서는 아니다.
최소한 스웨덴에서는 오늘날 부유세가 효과적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것은 폴크헴메트(국민의 집)인가, 부자의 천국인가이다.
케르스틴은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1950년대에 자랐고, 세금은 당연한 것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항상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날 스웨덴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되돌아보며 말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나조차도 가끔 그러다. 모두가 무엇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세금 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당신은 더 인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두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군가 돌봐줄 거란 걸 아는 그런 사회 말이다.”
*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변경되었다.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미란다 실드 요한손(Miranda Sheild Johansson)은 UCL 사회인류학 선임연구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